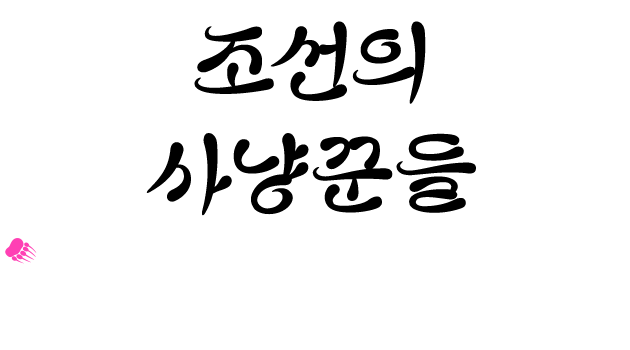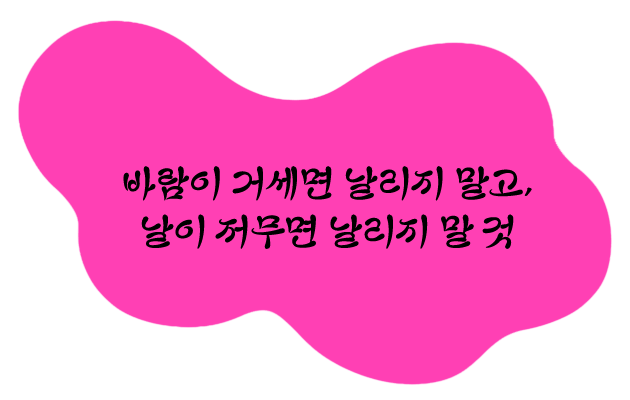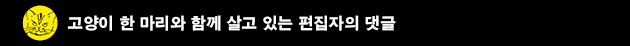|
화제의 역사책 『조선잡사』 읽기
$%name%$ 님, 한편을 같이 읽어요! 인간과 동물, 동물과 인간 이야기를 읽은 지 세 달째예요. 이번에는 조선 시대로 날아가 봅니다. 오늘날에는 수렵 허가기간 동안,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냥이 옛날에는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죠. 꿩을 잡는 인간, 꿩 잡는 인간을 돕는 매의 삼자 관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변방 백성 중에 조총을 잘 쏘는 자를 봤습니다. 호랑이가 삼사 간쯤에 있을 때 비로소 총을 쏘는데 명중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없으니 묘기라 할 수 있습니다.”
─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1725) 10월 15일
조선에서 중요하게 여긴 야생 동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꿩, 다른 하나는 호랑이다. 꿩고기는 종묘 제례에 빠질 수 없는 물품이었다. 임금 생일이나 단오, 추석 등 큰 명절이 오면 꿩을 서른 마리씩 바쳤다. 꿩과 반대로 호랑이는 퇴치 대상이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만 한 달 동안 120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 꿩을 잡아 종묘에 제사를 올리고 호랑이를 물리쳐 민생을 돌보는 일은 똑같이 중대한 나랏일이었다.
꿩고기는 응사(鷹師)라는 매사냥꾼을 동원해 마련했다. “꿩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매는 꿩 사냥에 요긴했다. 때로는 산 채로 잡아야 했다. 신선한 고기를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꿩을 산 채로 잡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매나 개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꿩을 산 채로 잡는 일에는 망패(網牌)가 나섰다. 망패는 그물을 다뤄 짐승을 포획하는 생포 전문 사냥꾼이었다. 망패는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 꿩이나 사슴을 상처 없이 잡았다.
응사나 망패와 달리 민가에서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은 산척(山尺)이라 불렀다. 임진왜란 이후 조총이 보급되면서 산척은 활을 버리고 총을 들었다. 이들을 산행포수(山行砲手)라 불렀고, 이후로 사냥꾼이라고 하면 으레 산행포수를 지칭했다.
기산 김준근의 「포수사냥가고」(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산척 가운데서도 평안도 강계(江界) 지역 산행포수가 유명하다. 호랑이 사냥꾼을 산척 중 으뜸으로 쳤는데, 평안도 강계에 호랑이 잡는 산행포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숙종실록』에는 근교의 호랑이를 퇴치할 목적으로 서북인(西北人, 평안도와 함경도 사람)을 뽑아 부대를 만들자는 비변사(備邊司)의 건의가 보인다.52 개항 직후 함경도 원산항에서만 한 해 호랑이 가죽 500장이 거래되었다. 평안도와 함경도 산척의 실력을 짐작할 만하다.
조선 사냥꾼 산척의 사격술은 외국인의 눈에 묘기로 비쳤다. 고종의 고문을 역임한 윌리엄 샌즈는 『조선비망록』에서 산척을 “탁월한 숲속의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샌즈가 본 산척은 심지에 불을 붙여 격발하는 구식 화승총을 들고 호랑이나 곰 가까이 다가가 단발로 급소를 저격했다. 『승정원일기』에 언급된 산척도 실력이 출중했다.53 1간이 1.8미터 남짓 되었으니, 그 산척은 3~4간, 곧 5~6미터 거리까지 호랑이에 다가가 사격한 셈이다.
산간에 폭설이 내리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움직이기 어렵다. 이때 산척은 설피(雪皮)와 설마(雪馬)를 착용하고 사냥에 나섰다. 설피는 눈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덧신이다. 설마는 서양 스키와 똑같은 모양의 썰매로 짐승을 잽싸게 뒤쫓는 데 썼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산골짜기에 눈이 두껍게 쌓이기를 기다려 한 이틀 지난 뒤 나무로 말을 만든다. 두 머리는 위로 치켜들게 한다. 밑바닥에 기름을 칠한 뒤 사람이 올라타 높은 데서 아래로 달리면 빠르기가 나는 것과 같다.”라고 적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설마 타는 소리가 우레 같아 호랑이가 이 소리를 들으면 옴짝달싹 못 했다고 적었다.
산척은 규율이 엄격했다. 산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며 상갓집에 조문도 가지 않았다. 몸을 청결하게 한 뒤 산으로 들어갔다. 짐승을 잡으면 반드시 혀나 귀 혹은 심장을 산신에게 바쳤다. 노루나 돼지를 잡으면 바로 귀와 혀를 끊어 나뭇잎에 싸 젓가락과 함께 높은 곳에 놓고 기도를 올렸다.
산척은 사격술이 뛰어났던 탓에 전란이 일어나면 우선 징집되었다. 프랑스가 강화도를 점령하자 우의정 유후조(柳厚祚)는 고종에게 산척을 차출해 싸우자고 주장했다. 산척은 평소 사냥터에서 생활하여 사격술이 예사롭지 않은 반면, 정규군 포수는 쌀만 축낸다는 것이었다. 오래 훈련받은 정규군보다 사냥터에서 맹수를 상대로 갈고닦은 산척의 사격술을 더 높이 평가한 말이었다.
1907년 9월 3일 「총포화약류단속법」이 시행되었다. 그해 11월까지 구식 무기인 화승총, 칼, 창이 9만 9747점, 신식 소총 3766정이 압수되었다. 압수한 무기 가운데 화약과 탄약이 36만 4366근이나 되었다. 총류 대부분이 산척의 것이었다.
총을 빼앗긴 산척은 생업을 바꾸거나 국경을 넘어 간도로 이주했다. 총을 버리지 못해 국경을 넘었던 산척 상당수는 무장 독립군에 헌신했다. 혀를 내두를 사격술을 지니고 맹수와 싸우며 엄격한 규율에 따라 생활했던 산척이었기에 산악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홍범도(洪範圖) 장군 역시 산척 출신이었다고 한다.
매사냥꾼은 팔뚝에 매를 얹고 산을 오르고
몰이꾼은 개를 몰고 숲을 누비네.
꿩이 깍깍 울며 산모퉁이로 날아가니
매가 회오리바람처럼 잽싸게 날아오네.
─ 정약용, 「최 선비가 사냥을 보고 지은 시에 답하다」
옛날에는 고기가 귀했다. 소는 농사에 필요한 데다 법으로 금지해 먹을 수 없었다. 돼지와 닭을 길러서 먹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대량 사육이 가능한 형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고기를 구하려면 사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멧돼지와 사슴은 찾기도 어렵고 잡기도 어렵다. 그나마 흔한 것이 꿩인데 역시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매를 길들여 꿩을 잡았다. 이렇게 매를 이용하여 사냥하는 매사냥꾼을 응사(鷹師)라고 한다.
매사냥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한다. 고구려 벽화에 매사냥 그림이 있고, 백제의 아신왕과 신라의 진평왕은 매사냥 마니아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의 충렬왕은 응방도감(鷹坊都監)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매사냥을 육성했다. 하지만 폐단이 만만치 않았다. 매사냥꾼들은 매를 뒤쫓느라 논밭을 짓밟았고, 달아난 매를 찾는다며 민가에 난입했다. 수십 명씩 떼 지어 다니며 행패를 부리자 응방을 폐지하라는 건의가 빗발쳤다. 응방은 폐지와 복구를 거듭하며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다.
태조와 태종도 매사냥을 즐겼다. 심지어 세종조차 가끔 매사냥에 나섰다. 신하들이 그만두라고 건의하자 세종은 역정을 냈다. “신하들은 매를 많이 기르는데, 임금은 새 한 마리도 못 기르는가?” 일단 매사냥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모양이다. 왕실의 응방은 역시 매사냥에 탐닉했던 연산군이 왕위에서 쫓겨나고서야 비로소 없어졌다.
그렇지만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꿩고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매사냥꾼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매사냥꾼들은 응사계(鷹師契)라는 조합을 만들고 세금과 부역을 면제받는 대신 왕실에 꿩고기를 납품했다. 그 많은 꿩을 매일 잡을 수는 없으니 길러서 바치기도 하고, 기른 것도 다 떨어지면 닭을 바쳤다. 그야말로 “꿩 대신 닭”이다. 숙종 때 국가에 등록된 매사냥꾼만 1800명이었다. 민간에서도 매사냥이 성행했다. 제사상이나 부모님 음식상에 고기를 올리기 위해서였다. 사냥을 할 수 있게 길들인 매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매사냥」. 그림 속에 매와 개가 보인다.
고려 시대 문인 이조년의 『응골방(鷹鶻方)』, 「몽유도원도」로 유명한 안평 대군의 『고본응골방(古本鷹鶻方)』 등은 우리나라 매사냥 문화의 수준을 보여 준다. 매 사육과 훈련 방법을 설명한 책도 나왔다. 이 책에는 매의 품종과 특성, 길들이는 법, 먹이 주는 법, 사냥하는 법, 병 치료법 따위가 자세하다.
우선 덫을 놓아 매를 잡는다. 그물에 산 닭을 넣어 매가 잘 다니는 곳에 놓아두면 제 발로 그물에 들어가 잡힌다. 이렇게 잡은 매를 어두운 방에 두고 수십 일 동안 천천히 길들인다. 손에 든 먹이를 받아먹게 하고, 부르면 오게 만든다. 매가 사람과 친숙해지면 슬슬 사냥을 나간다. 그렇지만 제약이 많다. 날이 덥거나 따뜻해도 안 되고, 초목이 무성한 계절에도 안 된다. 봄에는 오전, 가을과 겨울에는 오후, 대체로 초저녁이 좋다. 야생 동물이라 언제든 달아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굶주리면 사냥을 못하고 배가 부르면 날아가 버리니 체중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병들면 약을 지어 먹이고, 추우면 고기를 따뜻하게 데워 먹여야 한다. 상전이 따로 없다.
이렇게 정성껏 길러도 오래 쓰지는 못한다. 길어야 3~4년, 짧게는 1~2년 안에 대부분 죽거나 달아난다. 그런데 강재항(姜再恒)의 「매 기르는 사람 이야기(養鷹者說)」에 따르면 매 한 마리를 무려 35년이나 기른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오래 사는 매는 70년까지도 산다 하니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결을 묻자 바람이 거세면 날리지 말고, 날이 저물면 날리지 말라고 했다. 바람이 거세면 높이 날아가 버리고, 날이 저물면 집 생각이 나서 달아난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너무 자주 사냥을 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매가 지치기 때문이다. 꿩 세 마리만 잡으면 만족하고 더 이상 사냥을 시키지 않았더니 매가 오래 살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매사냥을 오래 하는 비결이다. 아랫사람을 늦게까지 붙잡아 놓고 일을 많이 시키는 사람이 귀담아들어야 할 이야기다.
─ 강문종, 김동건, 장유승, 홍현성, 『조선잡사』 중에서
아니, 조선 산간의 호랑이, 꿩, 매로구나 하면서 읽다가 너무 놀랐잖아요! 매사냥을 오래 하는 비결이 곧 아랫사람을 혹사시키지 말라는 뜻과 통하다니요? 남의 말인 줄 알았는데 내 이야기라 슬퍼졌어요. 날이 저물면 집 생각이 나서 달아나는 매에 자신을 자꾸 투사하게 되네요. 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는 요즘 새를 관찰하는 ‘탐조’에 다시 흥미가 생겼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회사 화단에서 바쁜 참새들, 집 앞 공원 나무 사이에서 떠드는 직박구리, 길에 떨어진 잔가지를 보고 고개를 위로 돌리면 둥지를 만드는 까치의 모습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올봄에는 쌍안경을 더 많이 들고 다니려고요. 잡아먹거나 길들이지 않는 동물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요.
요즘 나뭇가지 물고 이동하는 까치가 자주 보이죠. 직박구리는 언제나 동네에서 제일 시끄럽고, 까마귀 까악까악 소리도 부쩍 들려요. 이 모든 소리보다 공사판 소음이 크지만요. 《한편》 4호의 감동적인 글 「새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절로 떠오르네요.
“『조선잡사』는 잡(job)의 역사이며, 잡(雜)스러운 역사이기도 하다. 갖가지 직업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이 책에 어울리는 제목이다. ‘아재 개그’라 해도 할 말은 없다. 이만큼 이 책의 성격을 잘 알려 주는 제목을 찾지 못했다. 문명, 국가, 민족과 같은 거대 담론이 지배하는 역사 연구에서 직업의 역사는 여전히 잡스러운 역사인 탓이기도 하다. 조선 사람의 삶이 궁금한 일반 독자,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유용할 것이다. 직업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변화를 살핌으로써 미래의 직업을 전망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 들어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