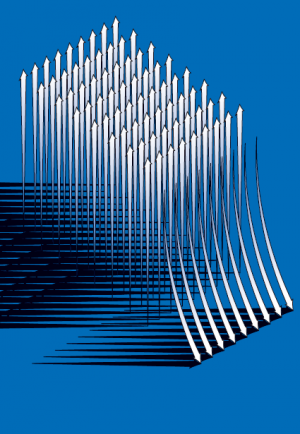처음 《릿터》를 만난 날이 기억나네요. 금요일이었어요. 판권에 책임 편집으로 이름을 올린 둘이서 파주에 있는 제본소에서 날아올 《릿터》를 기다리며 되지도 않는 잡무 같은 것을 붙잡고 있었죠. 금요일이라서 차가 밀리나, 제작부 정 대리님은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소식이 없고, 배는 고프고…… 하여 회사 1층에 새로 생긴 타코집에 갔습니다. 요즘 날씨와 어울리는 멕시코 음식을 시켜 놓고 어쩐지 긴장되는 마음을 숨기려 여기가 꼭 칸쿤 같다는 둥, 칸쿤보다 더 더울 거라는 둥 쓸 데 없는 농담 같은 것을 붙잡고 있었죠. 금요일이라서 차가 밀리나, 정 대리님 배춧잎 같은 주차하는 소리 들리지 않고 우리는 다 큰 성인답지 않게 자꾸만 무언가를 흘렸어요. 긴장해서 턱이 떨렸나 봅니다. 그때 정 대리님이 인쇄된 《릿터》를 들고 회사에 도착했어요. 저는 냅킨을 뽑아 아래턱을 닦으면서 자리를 박찼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릿터》예요. 첫인상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편집부에게 《릿터》는 우선 마냥 예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좋은 시작일까, 이것으로 된 것일까, 무언가 흘린 건 없을까, 이 모든 게 거대한 농담처럼 들리면 어떡하나, 우린 진지한데……. 별의별 걱정을 안은 채 책을 받았습니다. 책을 쓰다듬으니 코팅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경계가 느껴져 좋았습니다. 책을 펼치니 그동안 교정지와 PDF로 보아 온 페이지가 종이의 질감을 가진 생명체가 되어 감격스러웠습니다. 소중한 필자들이 보내 준 귀중한 글들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되지도 않는 잡무는 썩 걷어치우고, 이제 막 세상에 도착한 《릿터》를 품에 안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니 칸쿤인지 서울인지 날씨가 제 마음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날 서울의 바깥 온도는 섭씨 35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며칠은 여기저기에 “릿터”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책을 낸 편집자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일종의 애착증세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조금 심했나 봅니다. 여럿에게서 검색 좀 그만하라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친구를 누군가 나쁘게 느끼셨을까 봐, 이 친구가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을 드렸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검색해 모은 좋았던 말씀, 아쉬웠던 지적 모두 마음 속 엑셀 파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분히 정렬하고 소트하여 다음 호, 그 다음 호가 잘 나오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처음 《릿터》를 만난 날을 저는 영원히 기억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미래의 어느 날, 꾸준히 나오고 있을 《릿터》의 최근호 봉투를 뜯으면서 이 녀석을 처음 만난 날의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무엇을 먹었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누구를 기다렸는지. 그리고 읽는 당신이 어땠었는지.